이스라엘, 오랜 증오의 역사로 인해 생긴 공격적인 방어 자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발전된 해킹 부대 운영 중
[보안뉴스 문가용] 이스라엘에서 운영하는 첩보 부대 혹은 정부 부대의 이름은 Unit 8200이다. 방첩과 관련된 세계 여러 정보기관 중 가장 강력한 기술력과 정보력을 자랑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뛰어난 수재들을 선발해 부대원을 충원하고 있을 정도다. 세계에서 적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스라엘의 상황 상 이는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적이 많은 것일까? 인접 국가들이 죄다 적국일 정도니 말이다. 이스라엘의 정보전 지형을 살펴보려면 먼저 이스라엘을 둘러 싼 적들의 지형을 살펴야 한다.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와 무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보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의 현대사를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간략한 역사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다.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당시 팽배했던 반유대주의로부터 도망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20세기 초반에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쌓여갔다. 그러다가 1917년 이런 유대인들의 국가 설립을 지지한다는 영국의 밸푸어 선언이 있었다. 이를 국제연맹이 1922년 승인했고, 이스라엘 설립이 본격 가동되었다.
그러다가 세계 2차대전이 터졌고 나치 치하 아래 유대인을 향한 민족 대학살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48년 영국의 지지 아래 시오니스트들이 이스라엘의 개국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
물론 1948년의 이스라엘 개국 이전에도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있어왔다. 그러나 개국 선언으로 인해 애매한 노선을 취하고 있던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까지도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고 팔레스타인 아랍과 손을 잡게 되었다. 당연히 전쟁이 터졌다. 이 전쟁을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대참사라고 부르고 있다. 9개월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연합군은 휴전협정을 맺었다. 이스라엘은 단 1cm도 영토의 손해를 보지 않았고, UN헌장이 원래 아랍 국가의 영토라고 정해놓은 땅은 세 국가가 나눠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 팔레스타인 아랍은 없었다.
여기서 다시 갈등관계가 형성된다. 팔레스타인 아랍과 주위 아랍 국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갈등관계는 이스라엘과 나머지 아랍 국가 사이의 갈등만큼 세계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전쟁 때는 세계의 강대국들 역시 이스라엘 편, 아랍 편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이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에 섰다.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러시아는 아랍의 편에 섰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은 막강했다. 미국은 1천억이 넘는 비용을 이스라엘 군대와 경제 구축에 지원했다. 여기서부터 중동과 무슬림 지방에 반미주의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아직도 중동 지방에서는 증오의 이름이다. 하지만 이집트와 요르단은 증오의 수위를 낮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란은 절대 아니었다.
이란에 대하여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겪은 후 반미 색깔을 담뿍 띈 채 중동 지역의 패권을 노골적으로 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란이 취한 행동은 미국을 포함한 친미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아예 지워내겠다는 선포를 하기에 이른다.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현대사를 통해 숱한 무슬림 국가의 공격을 모두 버텨내는 등 힘을 과시했다. 방어만 견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1982년과 2006년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해 테러리스트를 소탕했고, 테러리스트의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 국민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를 공격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란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바삐 뛰고 있다. 1981년 이스라엘 공군은 이라크의 핵개발 시설을 파괴하기도 했다.
이런 정치지리학적 싸움은 이제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들어왔다. 2008년 이란의 핵 시설은 스턱스넷의 공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스턱스넷은 부시 정권의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고 방법은 다르지만 오바마 정권도 이란의 핵을 막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건 마찬가지다. 이란의 사이버 부대 역시 반격했고, 소리소문없는 사이버전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본격, 사이버전쟁의 시작
이란은 텔 아비브 증권거래소, 엘알 항공, 이스라엘 국제은행 등을 공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09년 1월, 가자지구 공격 직후 이스라엘의 인터넷 인프라 역시 공격을 받았고 이 와중에 적어도 5백만대의 컴퓨터가 마비됐다. 이 공격의 주체는 러시아인 것으로 추정되나, 이 러시아 해커들은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인 하마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란 정부와 모종의 관계인 것은 널리 알려진 바다.
2012년,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여러 웹 사이트들을 공격했다. 정식으로 보고된 것만 4백 4십만 번의 공격이 발생했다. 또한 2014년 가자 공습 기간에 이스라엘은 하루에 평균 9십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사이버전 능력이 강력한 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기반이 매우 허약하고 보잘 것 없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네타냐후 총리는 사이버 방어 부대 및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국가 시설 및 주요 인프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이버 공격까지도 다 막겠다는 의도였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동부서주 뛰고 있다. 여태까지 공격적인 방어 자세를 취한 이스라엘의 전적을 봤을 때 미국의 ‘완화 정책’이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와중에도 물밑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해킹을 하는 이유는 이처럼 강대한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글 : 마이크 월스(Mike Walls)
@DARKReading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jpg)
.jpg)
 TH.jpg)



 TH.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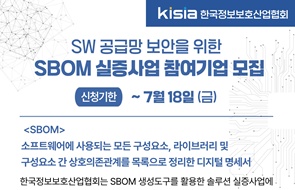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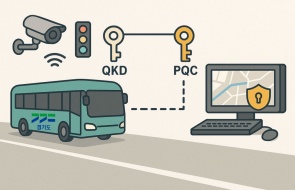


 TH.jpg)


 t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