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픈AI가 출시한 ‘소라2’ 같은 동영상 생성 AI는 전기와 물 사용량 더 커
2. AI가 쓰는 전기 2030년까지 2배 증가 예상도
3. AI 에너지 효율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 사용량 늘어나며 에너지 소모 더 늘일 수도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동영상 생성 모델 ‘소라2’는 기술적 경이로움과 동시에 인공지능(AI)의 막대한 환경 비용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과학 분야 전문 매체 ‘더컨버세이션’이 보도했다.
텍스트 몇 줄로 몇 분 분량의 초현실적 영상을 만들기 위해 소라는 천문학적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에너지 소비와 직결된다.
폭증하는 AI 연산 수요에 대응해 오픈AI는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5000억 달러를 투자해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컴퓨팅 역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환경 영향 역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오픈AI 소라2로 생성한 영상 [자료: 오픈AI]
AI의 환경 영향에 대한 논쟁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쪽에선 AI가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는 반면, 반대쪽에선 세계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AI가 동영상 생성 영역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관련 AI 기술의 환경 발자국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추적해 온 데이터 과학자 알렉스 드 브리스-가오(Alex de Vries-Gao)는 2025년 중반 AI의 전력 사용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De Nederlandsche Bank) 연구원인 그는 이미 AI가 글로벌 데이터 전력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며, 연말까지 이 수치가 두 배로 뛸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데이터도 이 경고를 뒷받침한다.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글로벌 전력 소비량의 1.5%를 차지했다. 글로벌 전체 수요보다 네 배나 빠른 증가세다. IEA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의 주요 동력은 AI이다.
MIT테크놀로지리뷰도 “2028년까지 AI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현재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로 인한 물 사용량도 문제다. 서버 냉각을 위해선 극도로 순수한 물, 즉 초순수(UPW)가 필요하다. 오픈AI의 GPT-3 훈련에 70만 리터의 담수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7년까지 AI 가동을 위한 물 사용량이 세계적으로 연간 40억~60억 입방 미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오픈AI 데이터센터에 연결된 물 재활용 장치 [자료: 연합]
하드웨어 교체와 제조 과정도 환경에 부담을 준다. AI의 엔진인 고성능 GPU 제조는 일반 소비자 가전보다 훨씬 큰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 에너지 집약적인 화학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초짜리 비디오 클립 하나를 생성하는 데 전자레인지를 1시간 넘게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전력이 소모된다는 초기 테스트 결과는 텍스트-이미지에서 텍스트-비디오로 전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에선 A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기술 및 정책 싱크탱크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 분석가들은 AI 에너지 사용에 대한 많은 추정치가 ‘잘못된 외삽’(外揷, faulty extrapolations)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I의 환경 영향에 대한 경고들이 현재의 증가 추세만 보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과장해서 예측했다는 비판이다. GPU 하드웨어는 매년 효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 건설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대부분이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공급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AI 모델 벤치마킹 결과들은 AI의 환경 발자국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구글은 최근 자사 제미나이 프롬프트 한 번 사용에 0.24Wh의 전력과 0.25mL의 물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에서 고화질(HD) 동영상을 1시간 스트리밍하는 것은 챗봇 텍스트 응답을 생성하는 것보다 약 1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AI 질의 응답 한 건의 환경 발자국은 작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이런 쿼리를 하루에 수십억 건 처리하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한 동영상 생성 쿼리가 향후 확산되리란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산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적 사용량이 늘어나 총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제본의 역설’ 현상이 AI 비용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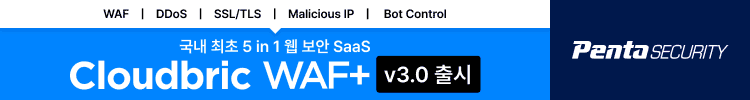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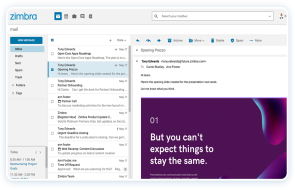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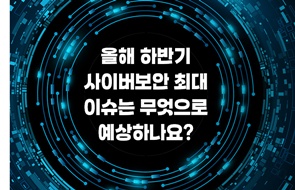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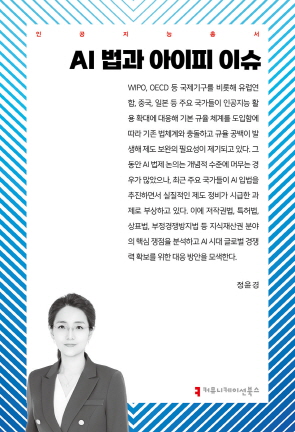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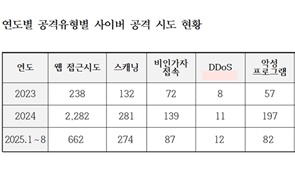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