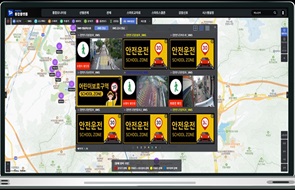국내 첫 전자코 반도체 모듈개발 박인규 카이스트 교수 “가능성만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생체를 활용한 신원인증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체인식의 방법으로 가장 대중화되고 있는 건 ‘지문인식’이며, 이와 함께 ‘홍채인식’, ‘정맥인식’ 등이 있다. 그밖에도 ‘얼굴인식’과 ‘음성인식’도 차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도나 복제 가능성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야나기다 타케시 일본 규슈대 재료화학공학연구소 교수가 발표한 날숨 생체인증 모식도[이미지=규슈대]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 국립대인 규슈대학의 야나기다 타케시(Takeshi Yanagida) 교수 연구팀이 ‘호흡’을 활용한 생체인증 관련 논문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나기다 타케시 일본 규슈대 통합재료학 및 공학연구소 교수는 도쿄대와 협력해 인간의 호흡에서 뿜어져 나온 화합물을 분석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후각 센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구는 영국 왕립화학회가 발행하는 저널인 Chemical Communications에도 공식 소개됐다.
해당 논문의 제목은 ‘호흡 생체인식으로 신원 감지-호흡을 이용한 생체인증 후각센서 개발’(Sniffing out your identity with breath biometrics-Researchers develop an olfactory sensor for biometric authentication using your breath)이다.
야나기타 다케시 교수는 해당 연구에서 “피부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인 경피적 가스의 휘발성 화합물의 농도는 몇십억 분의 일 또는 몇조 분의 일만큼 낮을 수 있지만, 호흡에서 내뿜는 화합물은 수백만 분의 일만큼 분별력이 높게 나온다”며 “이미 암이나 당뇨병 진단,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도 호흡을 이용해 양성 또는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나기타 타케시 교수 연구팀은 호흡을 생체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범위의 화합물을 식별할 수 있는 16개 채널의 후각 센서 어레이를 개발했다. 이 센서 어레이에서 측정된 피험자의 호흡(날숨)은 기계학습 시스템으로 전달돼 각 사람의 호흡 구성을 분석하고 개인을 구별하는데 사용할 프로필을 생성하게 된다.
연구팀은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테스트에서 평균 97.8%의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하는데 성공했으며, 표본(피험자)의 수를 20명으로 늘려 재실험했을 때도 큰 차이없이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언급했다.
야나기타 교수팀은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연령, 성별은 물론 국적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높은 정확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실험에 앞서 더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피험자들에게 테스트를 하기 6시간 전부터 금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야나기타 교수는 이어 “다음 단계에서는 식단과 관계없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첫 실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서 더 많은 센서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금식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추가 연구에서 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는지 알아봤다. 마침 일본 야나기다 타케시 교수의 연구가 알려진지 열흘 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최양규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와 박인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인간의 후각 뉴런을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 모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뉴로모픽 기술은 비록 ‘신원인증’을 위한 연구는 아니었으며, 냄새 원인 물질을 사전에 알고 있고, 이 물질의 다양한 조합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얻어내 이를 기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 이미지의 냄새를 측정했을 때 머신러닝을 통해 어떠한 냄새인지 판별하는 기술이다. 특정한 냄새가 들어오면 이를 ‘Confusion matrix’라는 표를 이용해 ‘OO 냄새일 것’이라고 확률 수치를 알려주게 된다.
일본 규슈대학의 호흡 생체인식 연구를 기반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들숨과 날숨으로 개인 신원인증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박인규 교수에게 질문한 결과, 아직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다.
박인규 교수는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은 광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감지 및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냄새를 활용한다면 여러 방해인자의 영향도 매우 크고, 이를 하나하나 실험을 통해 학습시키는 것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냄새 기반의 개인 신원인증은 실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Chemical Communications]에서 발표된 결과는 매우 한정된 숫자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정확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적용한다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며, 호흡을 활용한 신원인식의 상용화 가능성은 아직 희박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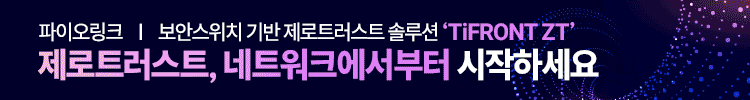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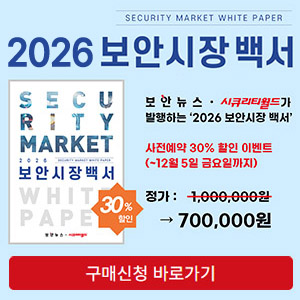






.pn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