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군의 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육군, 육사중심의 군 체계 때문에 해군은 ‘육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그 대안으로 해사에 간다’는 열등의식마저 있을 정도로 군의 비주류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해군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고 군 전력 다각화에 따라 해군의 군사적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iclickart]
최근 북한이 잠수함에 ICBM을 장착하는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우리 군도 보이지 않고 잠행하는 타깃을 쫓아다녀야 한다. 육지에 있는 고정 타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해군의 전력 향상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먼저 함정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배를 지칭하는데, 크기나 용도에 따라 나뉜다.
크게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전투함과 후방에서 전투에 사용될 인력이나 장비 등을 수송하거나 임무를 지원하는 지원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투함을 살펴보자. 전투함은 200t급에서부터 1만t급 이상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역시 항공모함이다. 전투기를 탑재, 발진 및 착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해군 기동부대의 중심 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대한 함정으로 대형 항모는 7만~10만 톤, 중형 항모는 4만~6만 톤, 경 항모는 1만~3만 톤에 이른다.
항공모함은 지상 항공기 지원이 곤란한 먼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대에 대하여 공중 엄호를 지원해 줄 뿐 아니라, 적 해상세력과 지상에 대한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먼 바다에서 해군 단독으로 입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 이 항공모함을 최초로 개발한 국가는 영국이며,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약 10개국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없다.
그 아래가 순양함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해군은 이 단계까지 내려와도 한국형 순양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순양함은 독자적인 전투능력과 충분한 군수품을 적재하여 대서양을 왕복 항해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순양능력을 갖춘 함정이다. 1만 톤 이상의 대형 전투함으로, 항모 다음으로 큰 배이다. 하지만 경항공모함보다 대형인 순양함도 있다.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순양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말하는 꿈의 순양함 제원을 잠시 살펴보자. 만재배수량은 15000톤급 내외로 대함미사일 16기와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대형대잠헬기 2대, 각종 수중레이더(소나), 전자장비, UAV의 구축이 필수다. 그리고 사거리 100~200km급 대공미사일, 사거리 20~30km급 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해야 하고, 지상공격용으로 사거리 1,000~3,000km급 순항미사일 50~100기 정도가 있어야 한다. 각종 전자전장비도 필수적이고 엔진체계는 최소 32노트급으로 가급적 핵추진엔진이면 좋다. 태평양에서 최소 2~3개월 작전할 수 있는 원양항해능력도 갖춰야 한다. 육해공과 해저까지 커버하는 완벽한 종합대응체계 함정이 바로 순양함이다.
항공모함은 그 운용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한국형 순양함은 대양해군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해군에게 막강한 순양함은 ‘그림의 떡’이다. 너무 강력한 스펙을 맞추기도 힘들고 향후 함정 기술의 발전에 따라 15,000톤급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로 예상된다.
그 다음이 바로 구축함이다. 바로 이 3단계까지 내려와야 우리나라 해군의 함정을 찾아볼 수 있다. 구축함은 잠수함을 잡는 함정이다. 따라서 잠수함보다 빠르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와 잠수함 공격용 폭뢰, 어뢰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함정 간 교전에 대비한 하푼(harpoon) 등 함대함 미사일과 함포 등의 무기들도 구비하고 있다. 4,000~1만t급에 해당하는 구축함은 대공, 대잠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주력 전투함으로, 우리나라의 KDX I(광개토대왕함급), KDX II(충무공 이순신함급), 한국형 이지스함인 KDX Ⅲ(세종대왕함급)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해군 함정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과 호국 인물의 이름을 따 붙인다.
사실 광복 후 우리 해군에는 변변한 군함 한 척 없었다. 해안경비를 위해 미군으로부터 인계받은 상륙주정(인원 및 장비 수송용)과 일본군이 사용했던 소해정(기뢰제거함정) 몇 척이 고작이었다. 이들 함정은 크기가 작아 함포를 장착할 수도 없었다. 이에 당시 장병들이 돈을 모아 미국에 가서 전투함을 사지는 못하고 미 해양대학교에서 퇴역한 구잠함(PC) 실습선을 1만8000달러에 사왔다. 3인치 포 1문을 장착하고 포탄 등을 실어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항했다.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다. 백두산함으로 무장한 우리 해군은 2달 후 발발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격멸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그 뒤 해군은 1972년 우리 손으로 첫 함정을 개발했다. 전국 800만 학생과 20만 교직원들이 모은 애국방위성금이 기반이 된 70톤급 고속정 ‘학생호’다. 이후 1974년부터 시작된 ‘율곡사업’으로 우리 해군은 국산 전투함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이 국산 기술로 건조됐다. 이를 기반으로 미사일 수직발사시스템 및 근접방어무기체계와 헬기탑재 격납고를 갖춘 국산 구축함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KDX(Korea Destroyer Experiment)Ⅰ 사업으로 탄생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다.
함정의 단계 가운데 세 번째 급인 KDX-1을 통해 탄생한 구축함은 1번함인 광개토대왕함과 2번함 을지문덕함, 3번함 양만춘함 등 3척이다. 한국형 구축함 시대를 연 3000톤급 KDX-Ⅰ으로 인해 우리 해군의 전력은 크게 향상됐다. 북한에 대응한 연안해군에 머물렀던 우리 군을 대양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시작점이었다. 이후 KDX-Ⅱ 사업은 4000톤급으로 배 크기를 더 늘리고 스텔스 기술과 다층방공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됐다. KDX-Ⅱ 사업을 통해 탄생한 충무공이순신함급 구축함은 총 6대다.
그 다음이 KDX-Ⅲ 사업이다.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된 7000톤급의 한국형 구축함 3척이 건조됐다. 첫 번째 함정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는 KDX-Ⅲ의 2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총 3척의 이지스구축함이 건조될 예정이다. 다음 하편에서는 구축함과 호위함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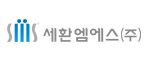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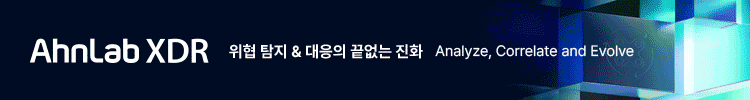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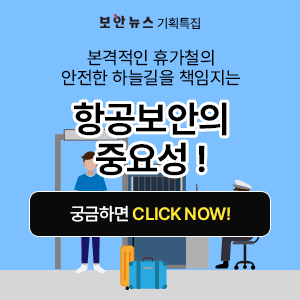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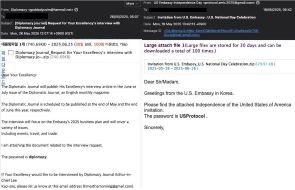




.png)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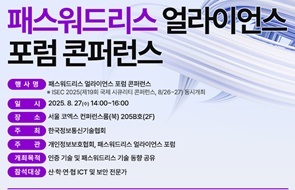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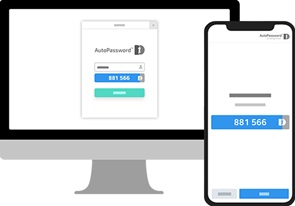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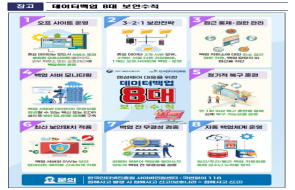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