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올해로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는다. 해방 뒤 남북이 38선으로 갈라지고 어수선한 정국이 이어지다가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았다. ‘6.25둥이’는 이제 환갑을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전쟁이 잠시 중단된 뒤 무려 64년 동안 휴전체제로 지내온 남북은 그동안 수많은 변화의 물결을 맞았지만 극단적인 군사대치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평화로운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남과 북은 지긋지긋하고 적대적인 대결구도를 끝장내고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6.25 전쟁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정리도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여전히 북침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6.25 전쟁 또한 두 체제가 넘어서야 할 중요한 역사적 장벽이다. 6.25 전쟁 67주년을 맞아 역사 속에 숨은 진실들을 담아봤다.
6·25 전쟁은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67년전 그날 이 땅위에서는 한민족 5천년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국가인 25개국 약 150만 명의 군인이 ‘미니’ 국제전쟁을 치렀다. 그 결과 한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명, 북한군 93만 명, 중공군 100만 명, 민간인피해 25만 명,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 만 명 등 당시 남북한인구 3,000만 명의 절반을 넘는 1,800여 만 명이 피해(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포함)를 입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는 미국이 5년간 치른 남북전쟁에서도 인구 3%에 해당하는 100여 만 명이었고, 제2차대전시 최대의 피해를 입었던 유럽도 인구의 10%인 3,000만 명이 인명손실을 입었을 뿐이다. 또한, 물적 피해도 전국토가 초토화 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못지않게 자못 컸다.(자료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알아봅시다! 6·25전쟁사‘> 중에서)
그렇다면 이 중에서 6.25 전쟁 최초의 전사자를 알 수 있을까. 북한군은 남침을 개시하면서 38 전역에 걸쳐 기선제압을 위해 일제 포격부터 실시했다. 하지만 강원도 강릉 정동진의 경우 포격이 아니라 북한군 정예군대가 먼저 공격을 가했다. 이런 과정에서 6.25 전쟁 최초 전사자는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난해 경찰은 66년 동안 제대로 조명도 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힌 6·25전쟁 최초 전사자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제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6·25전쟁 최초 전사자인 고(故) 전대욱 경사(추서 계급)의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27세였던 전대욱 순경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강릉 정동진리 등명해안초소에서 해안경계 및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해안경계는 주로 경찰이 섰다. 이날 새벽 3시쯤 전 순경은 발동선 30척, 어뢰정 4척의 대규모 북한군 상륙부대를 발견하고 초동대응을 했으나,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초소에서 전사했다.
정동진에서는 북한군의 포격이 아닌 기습상륙작전으로 6·25전쟁이 시작됐다. 새벽 4시로 알려진 6·25전쟁 발발시간보다 1시간 빠른 시간이다. 잠시 뒤 북한군은 새벽 4시를 기해 38선 전 지역에 걸쳐 남침을 감행했다. 동시에 강원도 내륙지역은 북한군 제2사단과 12사단이, 동해안 지역은 북한군 제5사단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경찰은 전대욱 순경을 시작으로 6·25전쟁과 공비토벌 작전에서 경찰관 1만 368명(강원 414명)을 잃었다. 고 전대욱 경사는 경찰과 군을 포함해 6·25전쟁 최초 전사자였다는 것이다.
정동진 바닷가 한쪽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간직한 ‘6·25남침 사적탑’이 세워져 있다. 사적탑엔 ‘38도선 전역에서 남침이 자행될 1시간 먼저 6·25전쟁이 시작됐다. 역사에 피 맺힌 증언을 명각하고자 한다’고 탑을 세운 목적과 당시 남침 설명을 새겨놓았다. ‘전대욱’이란 이름도 새겨져 있다. ‘순직경찰관대장’에는 고 전대욱 경사에 대한 정보가 기록돼 있다. 1923년 12월 7일생인 그는 강원도 영월군이 집이었으며 강릉경찰서 소속에서 근무하던 중 강릉군 강동면에서 순직했다. 전사보상금 4만 9235환 함께 광목 60마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그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측은 ‘군사편찬연구소에는 6·25전쟁 최초 전사자의 기록은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벽 4시경 일제히 포격을 가한 만큼 누가 가장 일찍 전사했는지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익히 알려진 대로 북한의 남침 시각이 새벽 4시가 아니라 강원도의 경우 1시간 빠른 3시경에 이미 ‘한국군’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쟁 개전의 시간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다음 편에는 6.25 전쟁 당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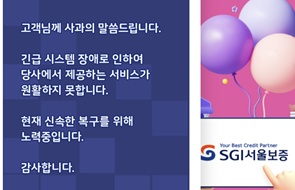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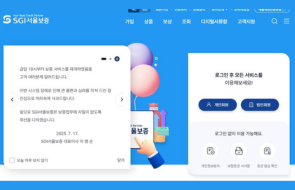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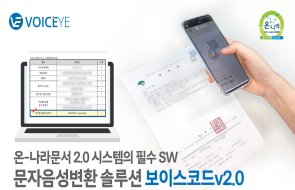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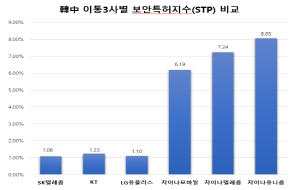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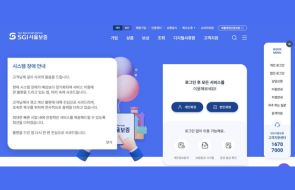

 t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