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청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할 때
도청의 시조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 하인들 가운데 ‘규비(糾婢)’라고 하는 직책은 그 당시 돈 많고 힘깨나 쓰는 양반가를 기웃거리며 그들의 은밀한 얘기들을 엿듣는 하녀들을 일컫는 것으로 현대 사회라면 이들은 첩보원이자, 도청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영어로 도청을 뜻하는 ‘eavesdropping’은 원래 ‘처마(eaves) 밑에서 엿 듣는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이처럼 외국에서도 최초의 도청기는 사람의 귀였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렇듯 도청(盜聽)은 오랜 기원을 지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청을 의미하는 말은 도청기술과 함께 변해왔다. 유선전화가 발명된 이후에는 ‘선(wire)에서 정보를 빼낸다’는 뜻의 ‘wiretapping’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였다. 전화선에 도청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가 대표적인 도청 수법이 됐기 때문이다. ‘벌레(bug)’를 숨겨놓는다는 뜻의 ‘bugging’이라는 말도 흔히 사용된다. 이는 전자공학의 발전으로 벌레처럼 작은 도청기를 몰래 설치해놓고 대화를 엿듣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탄생한 말이다. 또한, 최근에는 무선통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공중의 전파를 가로채 분석하는 ‘스캐닝(scanning)’이 도청을 뜻하는 말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도청의 원리는 간단하다. 마이크와 녹음기(송신기와 수신기),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연결장치로 구성된다. 연결장치는 유선, 무선(RF), 적외선, 레이저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로 이루어진 도청과 감청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청(盜聽)’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감에 따라 무조건 불법적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되는 것이 바로 ‘도청’과 ‘감청’이라는 단어다.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감청(監聽; Wiretapping)’과 ‘대화녹음·청취(聽取; Eavesdropping)’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도청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로 사용될 수 없다.
감청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두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법원장이나 대통령 승인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감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터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감청을 무조건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가에서는 합법으로 위장되고 포장된 불법적인 감청 행위를 근절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스파이존 이원업 부장(www.spy-zone.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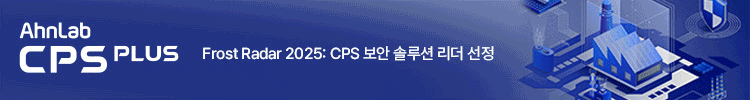




.jpg)

.jpg)






.pn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