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는 창작의식 저해할 수도
‘국민 여동생’ 문근영 씨가 모 CF에서 부른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표절 의혹이 계속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근영 씨가 부른 노래 ‘앤 디자인(& design)’의 후렴구가 가수 조덕배 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덕배 씨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앤 디자인을 작곡한 박근태 씨는 “나의 옛날 이야기는 알지 못하는 노래”라며, “최초 두 마디 멜로디 진행이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곡 전체적으로는 동형 진행이 반복되면서 일어난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두 마디의 멜로디가 같으며, 이 멜로디가 반복됐을 경우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어지고 있다.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이하 저심위) 관계자는 “표절여부를 본인이 알 수 있는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표절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느 만큼의 분량을 어느 정도 까지 비슷하게 쓰는 것을 표절이라고 규정하기에는 각 저작물마다 기준이 다르다. 신생 저작물에 다른 작품을 가져온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정할건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영화 ‘왕의 남자’ ‘웰컴 투 동막골’ 등 문화·예술 전반에 표절시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절 논쟁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은 가요계이다. 가수 이승철의 ‘소리쳐’는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와 비슷하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김태우의 ‘하고 싶은 말’은 니요의 ‘So Sick’의 도입부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솔로 2집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컴백한 이효리는 타이틀곡 ‘겟차’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Do Something’과 흡사하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는 모던 록그룹 더더의 ‘It‘s You’를 표절했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영화계의 표절시비도 만만치 않다. 1,230만 관객을 몰아 역대 흥행대작의 하나로 꼽힌 영화 ‘왕의 남자’는 희극 ‘키스’의 대사를 표절했다며, 피소를 당했으며, 800만 관객을 동원한 ‘웰컴 투 동막골’은 일본 영화 ‘스윙 걸즈’에 나오는 멧돼지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있어 표절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최고 흥행을 거둔 ‘괴물’은 일본 극장판 애니메이션 ‘폐기물 13호’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방과후 옥상’은 미국 필 조아누 감독의 영화 ‘세시의 결투’와 설정이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CF와 개그프로그램, 드라마에서도 표절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탤런트 윤은혜와 주지훈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드라마 ‘궁’은 인터넷에서 한 네티즌이 사용한 문구를 사용해 제작진이 공식 사과하는 사태를 빚었으며, 배용준의 차기작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태양사신기’는 만화 ‘바람의 나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김태희와 현빈이 출연한 LG 텔레콤 광고는 미쓰비시 자동차 광고의 배경과 분장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개그콘서트의 ‘붕닭’은 플래시 애니메이션 오인용 팀의 ‘돼지11편’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문표절은 학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관행’?
표절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분야는 학술분야이다. 우리 학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갖다 쓰는 일이 일상처럼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학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 등 야당은 교육자가 비도덕적인 일을 관행으로 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 부총리 사퇴 후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선임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의 관행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없었던 탓이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입법화한 나라는 없다. 미국의 많은 대학교에는 몇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인용하면 학위를 수여하지 않거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일정한 지침이 있다. 음악의 경우도 몇 마디의 멜로디가 같다던가 같은 리듬이 어느 정도 반복된다던가 하면 표절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학술이나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기준을 법제화 하면 학문이나 문화산업의 창조적인 발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저심위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법제화를 하는 것 보다 창작자 스스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보호해야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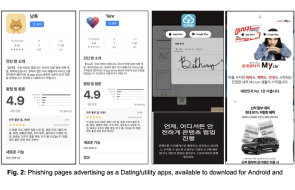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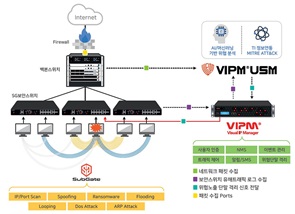


.jpg)



.jpg)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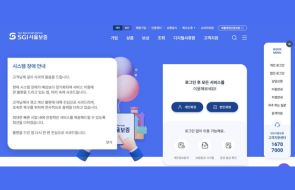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