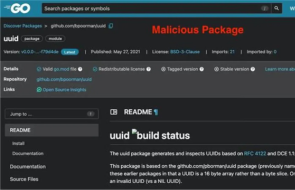특허 못지않게 디자인 출원도 강화...본사에 수천개 특허증 붙여 놓은 특허의 벽 전시
[보안뉴스= 유경동 IP칼럼리스트] PCT, 즉 ‘국제특허출원’ 6년 연속 부동의 세계 1위. 대한민국 한해 국가 연구개발비 예산보다 많은 31조원(238억달러)을, R&D 비용으로만 다 써버리는 기업. 천하의 애플한테 LTE 이동통신 특허 로열티를 받아내는 업체. 그렇다. 모두 이 회사, ‘화웨이’를 두고 하는 얘기다.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에 설치돼 있는 ‘특허의 벽’[자료=화웨이]
과거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임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의 연구실’을 꿈꾼다. 그만큼 엄청난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특허 출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최일선에 바로 화웨이가 있다. 이 회사 한 해 연구비가 BAT, 즉 중국 인터넷 3인방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의 1년치 R&D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을 정도다.

▲국제특허 출원 상위 5개국[자료=특허청]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PCT 출원 전 세계 1위 국가는 중국이다. 총 6만 9,562건을 출원, 무려 1만건 이상의 격차로 2위 미국을 압도한다. 여기서 화웨이는 자국내 최다인 7,630건의 출원을 기록, 명실공이 국가대표급 특허 체력을 뽐낸다. 미국 특허만 따로 떼어내 보면, 화웨이는 2022년 전년 대비 3% 증가한 3,023건의 실용특허를 등록, 전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갖은 제재와 핍박에도 불구, 화웨이의 특허 사랑은 그칠 줄 모른다.

▲미국특허 등록 상위 10개사[자료=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화웨이가 처음부터 특허나 R&D에 이토록 진심이진 않았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화웨이는 글로벌 IP시장에서 대표적인 먹이감였다. 여느 중국 업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기술을 베끼는 데만 열심이던 화웨이는, 지난 2013년 당시 미 벤처기업 어댑틱스(Adaptix)로부터 ‘직교주파수다중분할접속(OFDMA)’ 등 총 4건의 특허 소송을 당한다. 이듬해엔 파르테논이란 NPE(특허괴물)와 류진 후니조마키 등으로부터 각각 2건과 4건의 특허 소송에 잇따라 피소되면서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놓인다.
더 이상 카피캣(Copycat), 즉 불법기술 모방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단 걸 깨달은 화웨이는, 이후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에 적극 나선다. 이건 화웨이뿐만 아니라 단기간 초고속 압축성장을 해야만 했던 대다수 중국 업체 모두에 해당되는 수순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화웨이가 보인 일련의 IP경영 변화 과정을 보면, 전반적인 중국 정부의 전리(專利), 즉, 특허정책이나 그에 따른 자국 내 산업개혁 흐름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모델 훈련 시스템 및 방법과 저장 매체’ 특허도면[자료=특허청]
그럼 여기서 화웨이 최신 특허 하나 보자. 2023년 3월 화웨이가 한국 특허청에 등록한 ‘모델 훈련 시스템 및 방법과 저장 매체’라는 특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다. 특히, 백도어 등 고객정보의 불법 도용에 대한 각종 의심의 눈초리를 끊임없이 받는 화웨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특허는 데이터 호출 명령에 대한 극단적 훈련과 통제를 통해 저장 데이터의 누설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화웨이의 고민꺼리가 무엇인지는 물론, 이 회사가 한국시장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 이 하나의 특허로 모두 알 수 있다.

▲‘웨어러블 장치를 위한 제스처 입력 방법’ 특허도면[자료=특허청]
‘웨어러블 장치를 위한 제스처 입력 방법’이란 특허 하나 더 보자. 스마트워치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치명적 단점은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다는 것. 화웨이는 이를 놓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자그마한 디스플레이를 공중부양시켜 화면 위에서 움직이는 손동작을, 웨어러블 기기가 인식토록 한 것이다. 명세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 화웨이는 초음파와 적외선 센싱 기술을 활용했다.

▲유경동 IP칼럼니스트[사진=유경동]
중국 광둥성에 있는 화웨이 본사, 선전 캠퍼스. 이곳 G1동 4층 ‘엔터프라이즈 전시관’에 들어서면, 화웨이가 그동안 공들여 획득한 수천개의 특허증이 빼곡히 걸려 있는 벽면에 압도 당한다. 화웨이는 여기를 ‘전리장’, 즉 특허의 벽(专利墙, Patent Wall)이라 부르며 신성시한다. 우리 뿐 아니라, 서방국가 모두에게 만리장성만큼이나 높고 견고한 벽이다.
[글_ 유경동 IP칼럼니스트]
필자 소개_ 윕스 전문위원과 지식재산 전문매체 IP노믹스 초대 편집장, 전자신문 기자 등을 역임했다. EBS 비즈니스 리뷰(EBR)와 SERICEO, 테크란TV 등서 ‘특허로 보는 미래’ 코너를 진행 중이다. IP정보검색사와 IP정보분석사 자격을 취득했다. 저서로는 △특허토커 △글로벌 AI특허 동향 △주요국 AIP 동향과 시사점 △특허로 본 미래기술, 미래산업 등이 있다. 글로벌 특허전문 저널 英 IAM 선정 ‘세계 IP전략가 300인’(IAM Strategy 300:The World’s Leading IP Strategists)에 꼽혔다. ICTK홀딩스 최고마케팅책임자(CMO)로 재직중이다.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jpg)

.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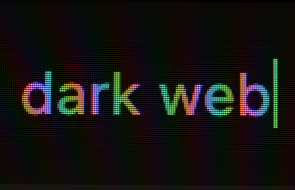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