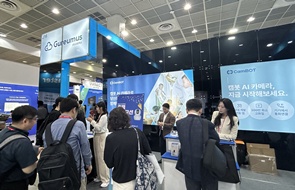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획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강조했다.

윤종인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 보호와 혁신의 동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개인정보 보호가 AI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AI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반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김 학회장은 “보호 없는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혁신 없는 보호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두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균형과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개인정보위, 미래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 과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감독 기능 강화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 △새로운 개인정보 위협 대응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생성형 AI와 스마트 카 등 신기술·신산업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를 통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신용정보와 위치정보 등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일원화해 중복 규제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민감도가 높은 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AI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를 의제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는 “AI의 핵심은 분석력과 데이터”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수세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아닌,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서울대 교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어떻게 배열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관련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의 조직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분산은 중복 규제부터 권리 침해 구제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도 불명확하게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일원화 및 체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AI·데이터 분야에 특화된 기술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세미나를 마치며 김 학회장은 “딥시크의 사례를 통해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규율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 기능 강화에 대한 주문이 규제 강화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위원회가 단순한 사후 규제자가 아닌 AI 시대를 준비하고 안내하는 전략적 조정자이자 균형자로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