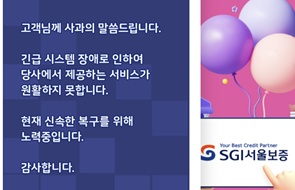소보원, 사기피해 방지 예방수칙 밝혀
전화벨이 한두번 울리다가 끊기는 전화가 있다. 부재중 전화로 발신번호가 남아있으면 통화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전화의 대부분은 대출업체로 060 전화번호로 통화하도록 안내해 정보이용료를 부과시킨다.
개인 신상정보 등 대출과 관련없는 내용을 물으면서 장시간 통화를 하게 한 후 “신용점수가 낮다” 혹은 “대출자격이 안된다” 등의 핑계를 대며 대출을 거절한다. 이런 전화는 유료요금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정보이용료도 상당히 비싸 심한 경우 수 십 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는 이 뿐 아니다. 공짜 휴대폰이라며 판매했다가 나중에 요금을 청구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이 나오고, 무료통화 이용권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해지하기 어렵거나, 타사 전환 시 위약금 대납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가입기념 사은품이라고 발송해 주고 나중에 물품대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교묘하고 지능적인 사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회원국이 주축이 된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에서 실시하는 사기피해 방지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수칙을 내놓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통해 사기꾼의 말에 속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기꾼은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사기성 거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기꾼의 흔한 수법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소비자를 조작하는 것이다. 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연달아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킨다. 혹은 지금 당장 구매하거나 입금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게 된다고 독촉하거나 협박하면서 소비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주위의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물건이 얼마 안 남았다” 등의 말로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독촉하는 경우는 속임수가 있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끼상품, 희소성 강조
소비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기 유형 중 하나는 공짜선물 등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무료 샘플이나 경품 당첨 등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이럴 때 소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정확히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제안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희소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기간이나 계약건수가 제한되어 있다며 성급하게 구매결정을 강요한다. 이럴 때 소비자는
“만약 그렇게 좋은 제안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후 그 제안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한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면서 소비자를 설득한 후, 약속을 이행한데 따른 부담을 준다면
“제안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한다.
◇인간관계를 이용할 경우
사기꾼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농담이나 칭찬을 통해 급속도로 친근감을 생기게 한 후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 때로 주위의 친분 있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직접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듣기 좋은 말로 몰아치지 마세요. 준비가 되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유연하게 대처한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있다”며 은근히 경쟁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웃 사람들, 또래와 비교하면서 안하면 왕따 당한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라고 딱 잘라 거절하도록 한다.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면서 권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고, 대기업에서도 사용하며,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한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예가 많다.
“객관적으로 보증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자체를 따져보도록 한다.
‘파격세일’이지만 현금입금 강요하면 사기
소비자들이 당하기 쉬운 사기는 파격적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사기성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며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가격비교사이트에 올린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반드시 현금으로 입금해야 하고, 사업자 정보가 휴대폰 번호 뿐이며, 배송기간이 일주일 이상 장기간인 경우가 많다.
공짜 이벤트나 무료 샘플 증정한다며 상품을 보내준 후, 대금입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인터넷 광고를 하루 30분씩 한달에 25일 동안 30개월간 보면 노트북 PC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 노트북 할부구입 계약을 한 것이며,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도주했으나 물건대금을 독촉 받는 피해사례도 있다.
공짜 이벤트라는 말을 들으면 사기가 아닌가 의심해보고, 비싼 상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면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에 현혹되어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거나 주소·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수 년 전에 구입한 어학교재 등이 장기계약이었다며 추가구독을 강요할 경우, 계약서나 녹취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업체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라고 잘라 말하고, 반복적으로 요구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청구한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의 광고에도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색칠하기, 십자수 등 부업광고는 회비나 보증금을 요구한 후 일을 해도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핑계로 보수를 주지 않거나 까다롭고 힘든 일감을 주어 일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매도 광고를 낸 사람에게 빠른 시간 안에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비용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발생한다.
소비자보호원의 시정조치를 빙자해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사기도 있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 등으로 현혹해 피해를 입히고,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금융정보를 빼내가기도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사기피해의 공통적인 유형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금을 강요하거나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독촉하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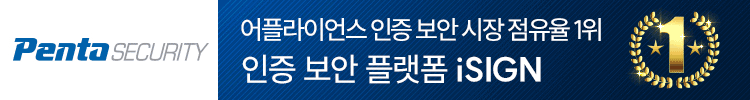


.jpg)
.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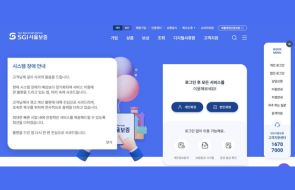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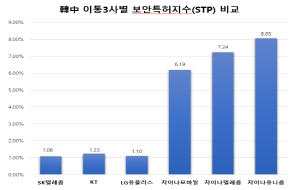

 th.jpg)